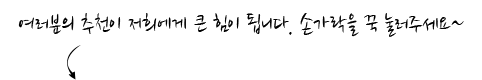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 향수...그리고 영화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by S
<파트리크 쥐스킨트 '향수'>
10년 전 무협 판타지에 빠져있던 그 당시, 어느날 조금은 색다른 소설을 읽어보고싶어
책방 한쪽에 얌전히 꽂혀있던 향수라는 책을 선택했던건 약간의 변덕이었다.
'향수'가 진짜 향에 대한 이야기일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채
(향수-perfume-와 살인자라는 타이틀이 전혀 연관 지어지지 않았기에)
살인자가 지난 추억을 그리워하는 내용인가? 라는 -_-;;
다소 웃기지도 않은 생각으로 아무 생각없이 읽기 시작했던 책이었건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용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그 독특함에 몰입하여 순식간에 읽어버렸다.
사실 향이란 것은 말로, 혹은 글로써 표현해내기 가장 난해한 것 중 하나이다.
인터넷에서 맡아보지 않은 향수를 고를 때
특정한 향수에 대한 설명과 후기를 몇백개 쯤 읽어도 그 향을 정확히 짚어 내기란 쉽지않은데
그만큼 후각이 관여하는 향에 대한 표현이 애매모호하고
또한 제각각 느끼는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오로지 읽는이의 경험과 상상력에 의존해야 하는 '향'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존재하지 않는 천상의 향까지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심히 놀라울 따름이다.
이 책은 시작부터 후각을 자극하며 상상하게 만든다.
악취로 인해 향수가 발달했던 18세기 프랑스.
온통 오물이 뒤섞여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진동하는 파리.
그 중 가장 지저분한 생선시장 한 구석, 생선내장더미에서 태어나는 주인공의 모습이
책의 단 몇 장을 읽는동안 불쾌감을 자아낼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던걸로 기억난다.
이렇게 최악의 악취로 시작한 향이 주인공 그루누이의 일생을 따라
마지막으로 갈수록 천상의 향으로 옮겨지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범상치 않다.
존재하는 모든향을 맡고 구별해낼수 있는 천재적인 후각을 지닌 주인공 장바티스트 그루누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특유의 향(체취)을 자신만이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의 향에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다.
어느날 우연히 맡았던 한 여인의 체취에 끌려 그녀를 살해하고 그 향기에 심취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향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게 너무도 안타까웠던 그는 향수 제조법을 배워 향을 가둬둘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고귀하고도 절대적인 향을 담아 만들어내고자
향수의 재료로 필요한 여인들을 본격적으로 살해하기 시작한다.
사람의 체취로 향수를 만들기 위해 살인을 하고 향을 담아낸다는 설정은 어찌보면 엽기적이다.
특히 마지막에 완성한 영혼마저 홀리는 향수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뼈까지 씹어먹히는 장면은 상당히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하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때문에 오랜시간이 흐른뒤인 지금까지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좋은평을 얻었던건
이러한 과정들이 별로 거부감없이 느껴질 정도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향에대한 집착과 함께 순수하게 표현해낸 작가의 능력이 아닐까 싶다.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살려 살인의 과정은 둘째치고 막판에 인간들이 뒤섞여 난교까지 벌어지는 이 영화가 15금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걸 영화로 봤던 건 책을 읽은 뒤 몇년 후, 한 케이블방송에서였다.
채널을 돌리다가 발견했던 영화의 일부분만 보고 바로 '향수'란 영화란걸 알아차렸을만큼
내가 상상만했던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냈는데
무엇보다도 글보다 더 어려운 영상이라는 매개체로 향을 소재로한 영화를 만들어냈다는데
감탄스럽기까지 했다.
물론 글에서의 섬세한 느낌들을 화면만으로 전개하기는 어려웠는지
(특히나 주인공은 감정표현이나 말이 거의 없기에) 나레이션을 첨가하긴했지만
주인공의 연기력도 뛰어났고 분위기라던가 배경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야되나?
상상속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범위였던 것을 실제 화면으로 옮겼을때
자칫하면 우스꽝스러워졌을지도 모를 장면들을 상당히 위화감없이 잘 표현해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마지막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사형장에서 모두가 그루누이를 신격화하고 찬양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살짝 웃기긴했지만 ㅋ
왠만한 소설들 영화화하면 소설의 반도 못미치는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건 배경음악과 함께 그 향의 느낌을 담아 최대한 시각적으로 보여주려한 노력과 흔적이 엿보였달까...
그리고 얼마 전 문득 생각나서 영화를 다시 찾아봤는데
2시간 반의 상당히 긴 영화임에도 이런 정적인 분위기의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다는건
역시 다시봐도 괜찮게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든다.
근데 난 볼때마다 느끼지만
그루누이가 향수를 온몸에 붓고 사람들에게 뜯어 먹히면서 끝나는 엔딩이 참 맘에들지 않는다.
분명 주인공 그루누이는 객관적 사실만을 놓고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엽기살인마인데
그 목적이 너무도 순수하고 숭고하게 느껴져서일까...
도무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 말이다.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현실의 욕망덩어리(?)인 내게는
잘만 이용하면 모든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만한 단 한병의 향수가
그루누이와 함께 마지막에 그리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